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작품에는 '제목'이라는 것이 있다. 제목은 한 작품의 내용이나 특성을 압축한 단어로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작품을 통해 묻고 싶었던 질문, 작품을 만든 이유, 작품으로 말하고 싶은 말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작품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일종의 '메인 카피'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간혹 '무제'라는 제목의 작품을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제목 없음'의 의미도 있지만 관람객들이 새롭고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러면서 자기만의 '제목'을 지어보는 시간을 주는 의미도 있다. 제목은 작품의 소재이자 주제이기도 하며, 작품을 이해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작품과 관람객을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도 한다.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목이다.
<이름의 기술>. 이는 지난 11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하반기 소장품 기획전의 제목이다. 이 전시는 '작품의 제목'을 조명하는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관람객이 난해하게 여길 수 있는 제목을 분류해 제목을 하나의 '창작의 영역'으로 살펴보는 전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목이 '제목의 기술'이 아닌 '이름의 기술'이다. 사람의 이름을 짓듯, 자녀의 이름을 짓듯 작품의 제목을 생각하고 지었던 작가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다.
먼저 전시는 다양한 '무제'가 선보인다. 김창열의 회화, 박현기의 영상 설치, 원경환의 점토 등 <무제>라는 이름이 붙은 작품들이 차례로 나온다. 왜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 난해하고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람객의 자유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과거 조각가 문신도 '무제'를 즐겨 사용했는데 이는 자신의 조각을 하나의 틀, 하나의 모형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생각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벌레'라고 제목을 정하면 관람객들은 그 작품을 '벌레' 하나로 통일하지만 '무제'라고 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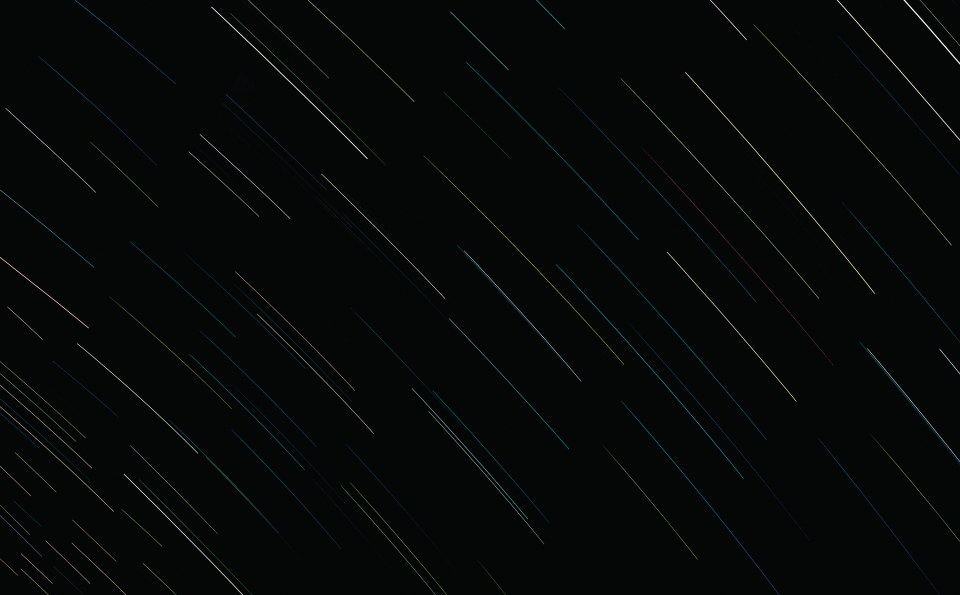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작품은 '기호'로 제목을 정한, 제목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을 하기 쉽지 않은 작품들이다. <3-X-69# 120>(김환기), <아(雅) 77-7>(최만린), <b. vfd. 46. 178392 1.216070-01>(김도균) 등 기호와 숫자, 알파벳이 뒤섞인, 난해한 제목을 단 작품들이다. 작가가 숨겨놓은 암호를 표기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독특하게 표현하고픈 방식을 차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기호를 정말 풀지 못하겠다면 그냥 자기만의 생각을 대입하라고 작품들은 이야기한다.
작품의 주제를 직접 제목으로 달거나 길지만 꼭 말하고픈 제목들의 작품들도 존재한다. <나는 사라질 것이다>(김상진), <유령이 좀 더 나아질거야>(정서영), <모욕하라, 비난하라>(바바라 크루거) 등이 그 작품들이다.

공성훈의 <예술은 비싸다>는 동전을 넣으면 LED 화면의 메시지에 따라 관람객이 YES 혹은 NO라고 답할 수 있도록 했다.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예술은 비싼가?', '이 작품이 과연 예술인가?'라는 선문답을 던지고 결국 자신의 답으로 마무리한다. 자연의 은밀한 모습을 영상에 담은 김순기는 그 장면을 <김순기는 여기 없습니다>라고 표현했고 김범은 다리미와 주전자, 라디오를 놓고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다리미 모양의 주전자, 주전자 모양의 라디오>를 만들어 내놓는다.
그 중 자신의 작업을 그대로 제목으로 한 토마스 사라세노의 작품 제목을 길지만 소개한다. <4각형의 통 안에서 Nephila seneglensis 거미가 1주 동안 살고, cyrtophora citricola 거미가 2주 동안 살고, 이후에 어린 cyrtophora citricola 거미 4마리가 1주 동안 살았다. 이후에 거미줄이 잘 보이도록 잉크를 분사하고 450도를 회전하여 접착제가 붙은 종이로 눌렀다>.
전시는 이처럼 제목, 그리고 이름의 의미를 살피면서 봐야하는데 각각의 작품들을 일일이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인상깊은 작품이 있으면 스스로 자기만의 제목, 자기만의 이름으로 표현해보며 즐기면 된다. 실제로 전시장 중앙에는 참여형 프로그램 '이름 게임'이 진행 중이다. 관람객은 하나의 작품을 선택해 게임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지을 수 있으며 이 이름은 작품 옆에 부착된 디지털 명제표에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되어 다른 관람객들도 볼 수 있게 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목에 달아야 할 단어들이 미리 지정되어 완전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이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술관 측은 "학생들이 비속어 등을 사용할 우려가 있어 단어를 지정했다"고 밝혔지만 정해진 단어들이 자칫 '생각의 자유'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분명 존재한다. 관람객들의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본 것은 아닌가라는 괜한 의심까지 든다. 사람은 생각의 표현을 정제해서 나타내는 능력이 분명 있다.
전시는 내년 2월 23일까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