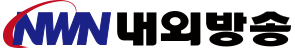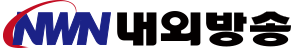'행동중재자'로서 제품 사용해야 장기적인 행복 높아져
첨단기술 제품은 '행동중재자'로서 디자인 돼야

(내외방송=정지원 과학전문 기자)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SNS,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행복감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UNIST는 11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김차중 디자인학과 교수가 ICT(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 경험이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사용자의 장기적인 행복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ICT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는 기준을 '사물적 기능'과 '도구적 기능', '행동중재자' 기능으로 구분했다.
사물적 기능은 제품이 주는 아름다움과 감각적인 경험을, 도구적 기능은 제품의 기능과 사용성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경험을 말한다.
행동중재자 기능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아정체성 확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116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오랫동안 사용했던 580개의 ICT 기술 적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정을 일주일간 하루에 세 번씩 보고하게 했다.

연구팀이 데이터를 분석해 순간적인 행복과 장기적인 행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행복은 사물적 기능과 도구적 기능, 행동중재자 기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적인 행복은 행동중재자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때 더 커졌다.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면 행복 수준이 더 높아졌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은 미학이나 도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데 국한됐는데, 두 가지 역할이 충족되더라도 장기적인 행복에 기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할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이 심미성과 도구성을 넘어 행동중재라로서 디자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정균 미국 코넬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에 최근 게재됐다(논문명: Positive Emodiversity in Everyday Human-Technology Interactions and Users' Subjective Well-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