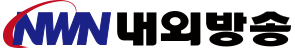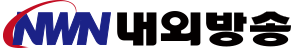(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숙적, 또는 앙숙이라고 한다. 양의계와 한의계 간의 관계를 말함이다.
제중원이 들어서기 전, 우리나라는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의학으로 환자를들 치료해왔다.
하지만 구한말 양의학이 자리를 차지하며 외과술을 비롯한 서양의학이 그 자리를 자치하게 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X-Rar,및 CT촬영을 통해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한는 것은 진료법에 어긋난다며 막고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직격간 논쟁은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궁여지책으로 한방병원, 한의원에서는 의사들과 병원을 같이 차려 운영하거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단독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디.
그런데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밭아들일까?.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지난달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기관 내 협진기관 64개소(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간 협진기관 11개소(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에 달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사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의진료료(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하여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첫 협진에 대한 '일차 협의진료료'와 그 이후 진행되는 협진에 대한 '지속 협의진료료'로 구분, 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 2주 후부터 산정 가능)수가를 도입했다.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해 지급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 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한다.
1∼3등급으로 구분됐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병원만 보더라도 양방과 한방치료가 병행된다. 이는 동국대병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여전히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성공할지 양-한방 간 협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환자들을 위해서는 직역간 대립보다는 일종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회에서도 법안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한의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