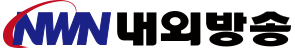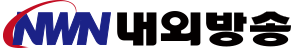(내외방송=김서정 박사) 맹자(孟子)가 어떤 근거로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善)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도덕적 자기수양(自己修養)이 가능한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先天的)으로 도덕적 성향(性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타고난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든지 우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 아이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고 측은(惻隱)한 마음에 구해주려 하는데, 이것은 아이의 부모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도 아니고, 뭇사람들에게 명성(名聲)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측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잔인(殘忍)하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곤경에 처한 어린이를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맹자 자신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천성(天性)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서적(情緖的) 반응을 맹자는 인간에게 내재돼 있는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지켜야 할 도리나 행동규범의 기반인 도덕론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이는 도덕적 원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측은해 하는 것은 인(仁)의 실마리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실마리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실마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은 지(知)의 실마리라고 했다.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사람의 정서적 반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도덕감을 상실(喪失)한 행동들이 자주 나타나는가에 대해 맹자는 풍년(豊年)에는 선하고, 흉년(凶年)에는 포악(暴惡)한 것을 관찰(觀察)했다. 즉, 맹자는 본래 마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 훼손되는 것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본래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생활 속에서 훼손되면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는 선의 왜곡일 뿐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맹자는 벌거벗은 산(山)을 보고 과거에 울창한 숲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외부적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훼손(毁損)되는 것을 방지(防止)해야 한다는 마음 수양의 한 가지 원리(原理)를 발견했다. 또한 마음이 훼손되는 원인으로 외부적 환경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인 이성이 고장이 나게 되면 감각적(感覺的) 행동을 제어(制御)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도덕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훼손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 환경 개선이다. 요즘 시각으로 본다면 맹자는 경제적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마음 회복의 요소이다. 현명한 군주라면 위로는 부모를 모실 수 있게 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맹자는 설파(說破)했다.
그러나 경제력 확보가 도덕감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가 곧 도덕감 회복과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면서도 자신의 상실된 도덕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한탄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외부적 경제 개선과 반드시 잃어버린 진심(盡心)의 마음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덕감의 수양은 진심(盡心)을 통한 도덕 능력의 자각과 존심을 통한 도덕 능력의 보존과 실천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先天的)으로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도덕적 성향은 도덕원리(道德原理)나 규범(規範)이라기보다는 도덕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潛在力)이며, 수양을 통해 길러지는 씨앗과 같은 가능성의 능력이다.
맹자가 마음의 사유 능력을 진심(眞心)과 존심(存心)으로 나눴듯이 마음속에 내재 된 진심을 통해 새겨진 도덕감을 자각하고, 존심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반복적인 바른생활 습관이 마음에 배어서 우러나오는 올바른 행동 도덕적 체득(體得)이 절실한 현재이기도 하다.

● 김서정 박사
- 시인
- 상담심리학 박사
- 『작은 영웅의 리더십』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