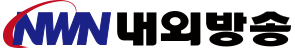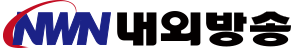(내외방송=김서정 박사) 무엇을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인 욕망(欲望)에는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의 욕망 이야기에만 주로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즉, 동양의 욕망론(慾望論)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등한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동양철학에서도 서양철학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욕망론에 대한 연구가 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성적 접근에만 치우친 것으로 보여지는 서양의 욕망론보다는 동양철학의 욕망론이 더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고 분별되기도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대학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하게 ‘좋은 세상을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 그리고 내 주변에서부터 제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즉, ‘스스로 자기중심적 욕망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거짓 위선에 불과하다.’는 의미도 된다.
이처럼 유교 철학에서도 욕망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유교 철학의 대가(大家)인 공자(孔子)는 그가 남긴 저서 '논어' 속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 영원한 가르침을 통해 불멸의 인간이 된 것이다.
사실 그는 현실 정치에서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일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소박한 생활보다는 위대함 속에 소속되는 것을 원했다. 그는 큰마음의 결핍 속에서 그리고 그 결핍이 큰 만큼 위대한 욕망의 대상을 찾아 방황했다. 그러한 욕망하는 생활의 결실이 '논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욕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하는 방식이나 욕망하는 대상 선정이 문제일 뿐이다.
유교 철학의 대가인 공자 역시 욕망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 자신이 욕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욕망을 해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境地)에 도달하는 것을 욕망했다. 그래서 그는 70세에 마음이 욕망하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었다(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는 선언을 하게 됐다.
놀라운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해도 모두 다 예(禮)와 법도(法道)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꿈꾸기 어려운 인격의 경지(境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인격의 경지는 타고난 성품인지 누구나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하지만 공자는 타고난 자질로 말하지 않는다. 부단히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결과라고 주장한다(非生而知之者 不如丘之好學也).
공자는 스스로 매일매일 새로워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경지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人)과 신(神)의 연결 가능성을 주장하는 말이다. 서양 특히,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며 신은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이므로 이 두 존재 사이의 어떠한 연속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배려를 통하지 않고 선택받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구원이란 절대적인 신의 세계와 연결돼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자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것은 그는 죽을 때까지 욕망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비록 현실 정치에서 실패한 인간이었으되 좌절하고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공자는 자잘한 삶을 비판한다. 잘디 잔 사람들은 따져볼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噫 斗筲之人 何足算也/희 두소지인 하족산야 : 어허, 도량이 좁은 사람들을 어찌 헤아릴 것이 있겠느냐?).
그는 모자람보다 차라리 넘치는 것을 칭찬했다. 그가 가장 선호하는 길은 중도(中道)의 길이었다. 중도의 길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생활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중도의 길을 사는 사람을 얻을 수 없다면 반드시 뜻이 높은 사람이나 소신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려고 했다(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乎).
논어에 나타난 공자는 소박한 일상을 살더라도 끝까지 위대한 존재의 일부가 되려는 열망과 욕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궁극적인 대상은 하늘을 믿고 향(向)했다.

● 김서정 박사
- 시인
- 상담심리학 박사
- 『작은 영웅의 리더십』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