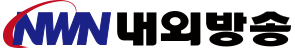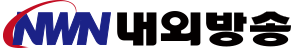강소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모델을 적용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동해안특구는 자동차·조선, 철강·소재 등 지역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경북(경주·포항), 울산 일원 23.1㎢(700만평)의 R&D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지정 요청 당시 범정부차원에서 국내 특구제도 전반에 대해 개편을 준비함에 따라 동 건은 접수 이후 진행이 보류됐다.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신기술과 일자리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설정하는 플랫폼으로서, 대덕을 비롯해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가 있고, 그간 공공연구성과 전주기 사업화지원 등으로 9,304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5개 특구 총 138.8㎢(4,200만평)에 4,330개 기업과 29개 대학, 78개 공공연구소가 있으며, 매출 44.1조원, 고용인원 175천명, 연구개발비 9.7조원 규모를 담당하는 등 지역의 경제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권역이 분산·대형화됐고 새로운 R&D집적지 중심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과 연구개발특구만의 차별화된 활용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를 명실상부한 혁신플랫폼으로 도약시키고자, ‘연구개발특구 2.0 발전전략‘을 마련해 8월 중 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 병원, 공기업 등의 지역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특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소형특구 모델을 새롭게 추가하고, 법령정비를 통해 특구지역 안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TFT는 연구개발특구 관련 전문가 20여명으로 혁신분과와 기반분과를 구성하고, 관계 지자체 등을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다.
TFT 운영을 통해 ‘특구 2.0 발전전략‘을 실제로 적용할 계획이며, 동해안특구를 신규 특구모델의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전 정부 당시 요청·접수된 경남(부산특구), 전남(광주특구) 등의 기존특구 확대 건에 대해서도 신규 모델로의 적용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TFT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제도 개편 방향이 현실화된 첫 모델이 동해안특구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