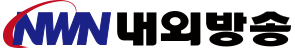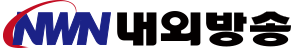경기상황과 동세대 평균기대수명에 따라 수급액 변화도 운영의 묘

(서울=내외방송)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연금개혁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복지강국인 스웨덴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어제(3월 27일) 여의도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는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의 저자 박지우 작가를 초대해, 스웨덴의 연금과 복지정책을 주제로 하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박 작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스웨덴의 경우 연금개혁에 약 15년이 소요됐다"며, "정치인이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 집단위원회를 구성해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공론화 과정을 오랜 시간 거쳤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충분한 여론 설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논의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형 연금 개혁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 공론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박 작가는 이어 "스워덴에서는 1992년에 초안이 나오고 법제화에만 2년이 걸린 후 1999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연금개혁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지우 작가는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률은 약 9%이지만 스웨덴은 18.5%"라며 "우리나라는 스웨덴보다 사회진출이 늦고 퇴직은 이른 편인데다, 고령화 저출산이 심각해 오히려 보험료율을 스웨덴보다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스웨덴은 연금지급액을 경기활성화에 따라 호황기는 높이고 불황기는 낮추는 방안을 운영 중이며, 동세대의 기대수명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의 '중과세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박 작가는 "우리나라는 복지욕구는 높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가 많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무상복지에는 항상 질적 저하가 동반될 수 밖에 없는데 반해 스웨덴 국민들은 복지 자체에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우 작가는 스웨덴에서의 직장생활 경험을 토대로 의료, 주거, 교육, 연금, 보험 등 각 분야에 걸친 스웨덴 복지정책의 장단점을 자신의 저서를 통해 분석했다.